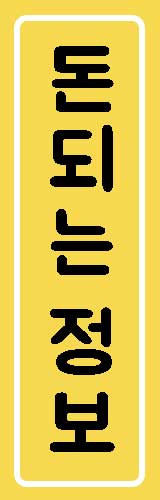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역사상 이에 대한 고민은 시도 때도 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가 만연한 중세 시대에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된 존재로 생각했으며, 마음은 영혼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심하면 종교재판에 처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전통적인 영혼의 개념이 다소 힘을 잃었으나 아직 많은 사람은 마음이 육체에 귀의할 뿐이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 책 <마음의 과학>은 전통적인 영혼관에 입각한 사람이 읽기에는 적잖은 불편함이 있다. 특히 톡소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내용을 볼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 고양이 똥에 존재하는 단순한 기생동물이 임산부의 몸에 들어가면 출생한 아이가 선천적으로 좀 더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마음이란 게 아주 작은 동물로 인해 바뀔 만큼 나약한 것일 줄이야. 인간의 행동이 기계랑 다를 게 없는 건 아닐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사실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반응이다.’ 저자의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타인을 구하는 이타심마저도 인간이란 종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 기생생물, 바이러스 등이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 결국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다른 생물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뤄지는 알고리즘 같은 것이고 이는 기계의 작동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행위 전체를 설명할 순 없다. 마음은 본능 즉, 기계적인 행동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교육과 문화, 규범이라는 장치들이 얼마나 인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서로 돕고 국가를 형성한 것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원칙이 사람의 내면을 교정하고 이끄는 역할로 자리매김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의 규범 가치가 된 것이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마음이란 빙산의 안쪽인 이드(욕망)와 그 위의 자아, 초자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윗부분으로 갈수록 사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마음이 완전히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앞서 말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역시 이기적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건 인간의 의지뿐이라고 역설한다. 여기서 의지는 사회적 가치가 내면화된 인간의 이성이다. 이를 통해 선천적으로 형성된 본능의 마음을 정신적인 행위로 교정할 수 있다.
사람은 본능의 기계도, 이성적인 신의 형상도 아니다. 우리는 동물의 한 종이지만 조금 특별할 뿐이다. 선천적인 욕망이 있음에도 이를 저지하는 이성이 있고 언제나 둘은 싸우고 있지만 어느 때는 협력한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만 한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번영해 나갈 것이다. 내가 오늘 단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도 설탕을 바라는 내 신체의 욕망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 이성이 있어 서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오늘도 초콜릿을 입에 든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책과 나 > 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월 7일. 제 4의 실업(MBN 일자리 보고서팀) (0) | 2018.01.15 |
|---|